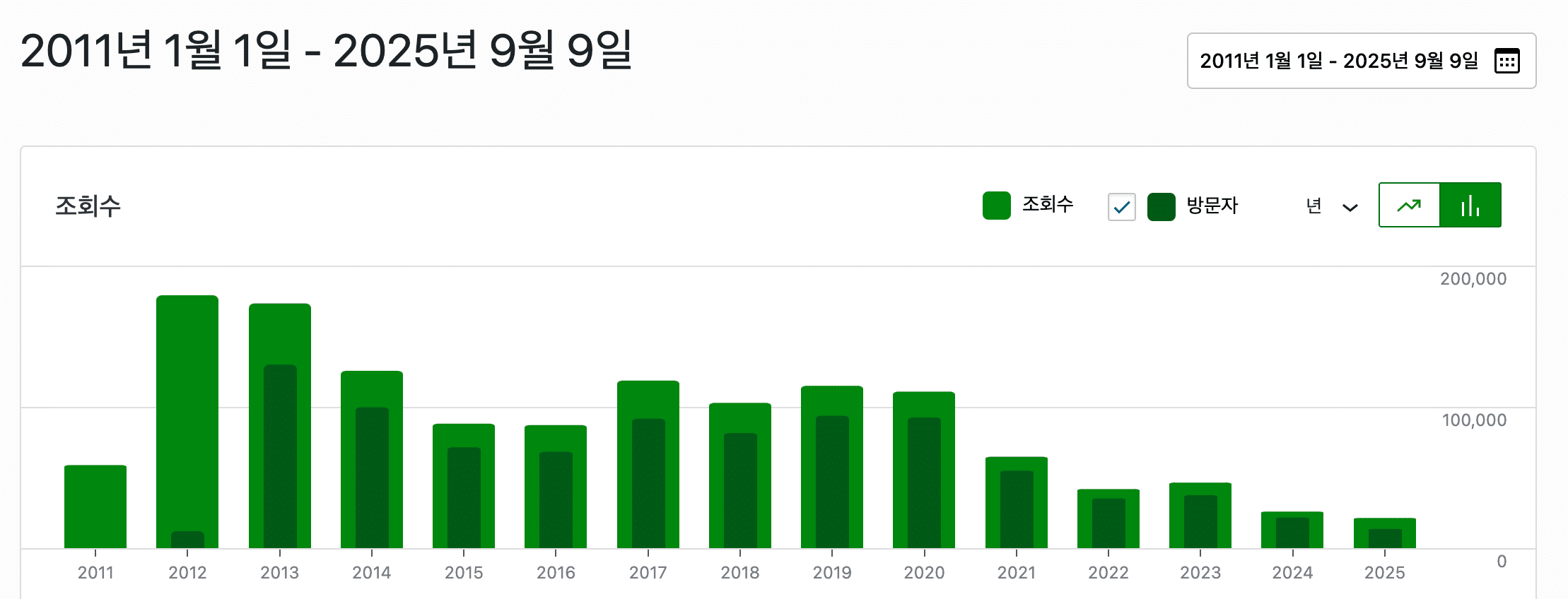불경스럽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매년 생각이 미치면 하는 일이 있는데, 유서를 고쳐쓰는 것이다. 자필로 백지에 법적인 절차에 맞추어 유서를 쓰고 날인을 하면 뭔가 마음의 정리가 되는 느낌이다. 대단한 재산이 없는 나로써는 대체로 동산이나 장례 등의 처리를 맡기는 것이 대부분이나, 올해는 뭔가 ‘특별한’ 것의 사후 처분을 맡기는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나는 고민했다. 내가 죽고 나서 내 블로그, 내 디지털 유산이 계속 유지되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나 내 블로그는 웹호스팅 업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매년 사용료를 내야만 한다. 도메인도 요금을 내서 갱신을 해주어야 한다. 지금껏 내가 해오고 있으나 내가 죽는다면 누군가가 내 대신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멸해버리고 말 것이다.
또 있다. 내가 만약 죽어 버린다면 나는 갑자기 사라져버릴 것이다. 내 트윗은 내가 내 손으로 남긴 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고, 내 포스트는 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그대로 멎을 것이며 내 페이스북 업데이트 또한 그럴 것이다. 내 존재의 ‘마무리’는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은채 그냥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냥 트위터를 관뒀나 보다. 페이스북을 관뒀나보다, 블로그의 업데이트를 관뒀나보다. 라고 기억되기는 싫었다. 적어도 누군가가 내 부고를 남겨주기를 바랐다.
나는 그런 까닭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디지털 유언 집행인’으로 지정하고 내 호스팅의 연장과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접근할 수 있도록 별지에 조치를 적어놓았다. 그리고 유서 본문에 그 집행인에게 필요한 모든 편의와 금전적인 지원을 베풀 것을 요청해 놓았다.
유족에게 고인의 디지털 자산을 액세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논쟁이 한참 있었다고 기억한다. 그것과는 좀 더 다른 의미에서 디지털 시대의 내 사후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올해의 유언 작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