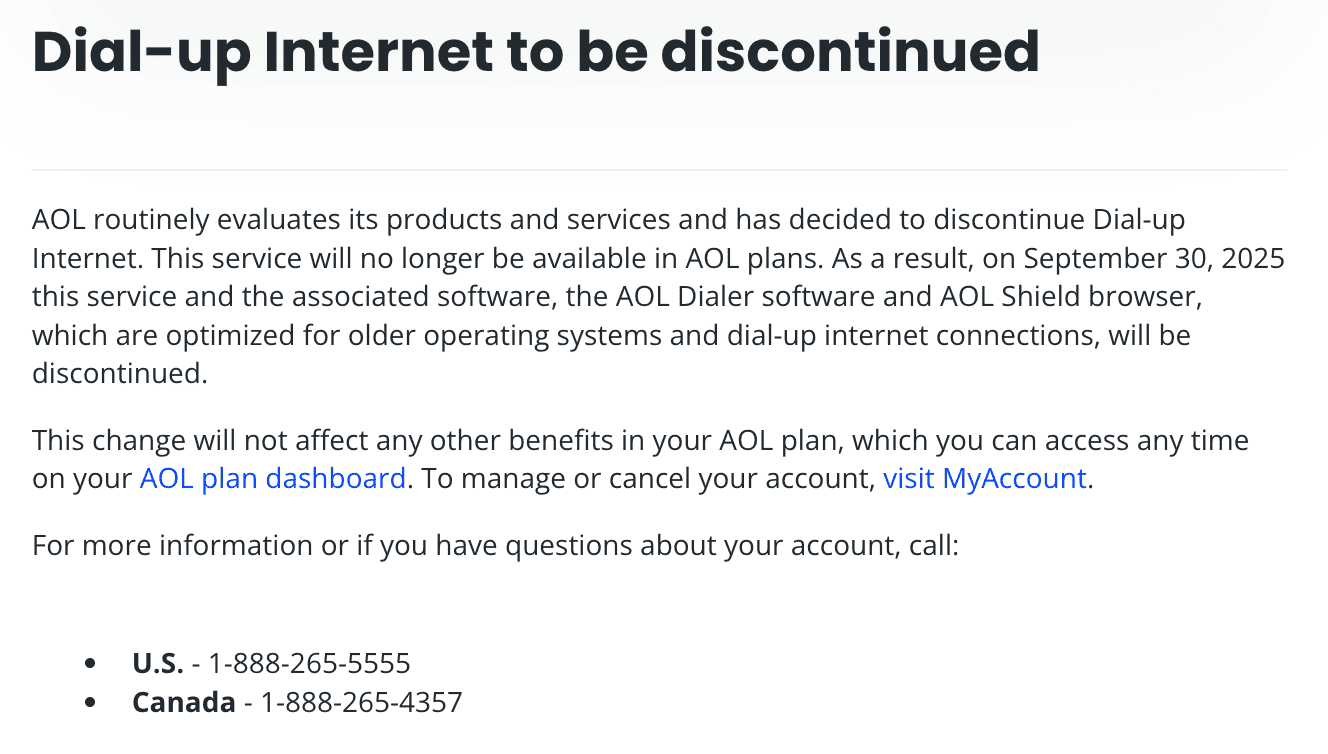지난 글 ‘Evernote의 몰락, 한때 10억 달러 가치의 서비스는 어떻게 무너졌나‘에서 Evernote의 전성기와 몰락을 정리했었다. 생각 이상으로 반응이 좋아서 좀 더 파봤는데, 파면 팔수록 빠진 이야기가 꽤 나오니, 글 하나가 되어 버렸다.

새벽 3시 10분의 이메일
Evernote에는 나름 유명한 창업 신화가 하나 있다. 2008년 10월 이야기다.
Phil Libin은 몇 달째 투자 유치에 매달리는 중이었다. 유럽 투자사 하나랑 1,000만 달러짜리 딜을 거의 마무리했는데, 서명 당일 아침에 전화가 왔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 여파로 펀드 가치가 60% 날아갔다고. 투자 백지화.
더 큰 문제가 있었다. 그 투자사랑 배타적 협상(exclusivity) 계약을 맺어놓은 상태라, 다른 투자자들이랑은 얘기를 다 끊어둔 뒤였다. 회사에 남은 돈은 3주치. 1주일간 아는 사람 전부한테 전화를 돌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 한복판에 전화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그래도 한 군데서 연락이 오긴 했다. 조건이 붙었다. “사용자 데이터로 타겟 광고를 해라. 사람들이 뭘 기억하고 싶어하는지 아는 건데, 그게 타겟 광고의 성배 아니냐”는 논리. Libin은 거절했다.
그날 밤, 다음 날 아침 전 직원 해고하고 회사를 접기로 마음을 먹었다. 불 끄고 침대에 눕기 직전, 습관처럼 이메일을 한 번 열었다. 새벽 3시.
스웨덴에서 온 메일 하나가 있었다. Evernote를 두 달째 쓰고 있는데 인생이 바뀌었다는 내용. 그리고 끝에 한 줄. “혹시 투자가 필요하면 말해달라.”
20분 뒤 Skype 통화를 했고, 2주 안에 50만 달러가 입금됐다. 이 스웨덴 사람은 IT 회사를 세워서 매각까지 해본 개발자 출신이었고, 두 사람은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 그 스웨덴인의 이름은 끝까지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다.
50만 달러가 Evernote에 6개월의 시간을 벌어줬다. 그 사이 사용자 지표가 쌓이고, 프리미엄(freemium) 모델이 돌아간다는 숫자가 나왔다. 이후 일본 DoCoMo Capital, Sequoia Capital 같은 큰 손들이 줄줄이 들어왔다.
Libin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 “그 이메일이 10분만 늦게 왔으면 난 이미 자고 있었을 거다. 아침에 모르는 사람한테서 온 메일을 열어봤을 리도 없고.”
멋진 이야기다. 다만 돌이켜보면, 제품에 반해서 50만 달러를 보낸 팬 덕에 살아난 회사가, 결국 그 팬들을 등지는 쪽으로 끝났다는 게 좀 씁쓸하다.
“100년 기업”이라는 꿈
Libin에게는 유명한 선언이 있었다. Evernote를 “100년 기업”으로 만들겠다는 것. 2012년 Inc. Magazine이 ‘올해의 기업’으로 뽑았을 때, 이 비전은 실리콘밸리에서 꽤 낭만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빨리 키워서 IPO하고 빠져라”가 당연시되던 시절이니까.
문제는, 이 거창한 비전 아래 너무 많은 걸 벌여놓았다는 거다.
쇼핑 중독: 2011년의 인수 행각
Evernote가 한창 잘 나가던 2011년, Libin의 전략은 명확했다. “Evernote 생태계”를 만들겠다는 것. Sequoia Capital에서 5,000만 달러를 받자마자 앱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TechCrunch에 따르면 2011년 한 해에만 4개 회사를 인수했는데, 놀라운 건 이걸 거의 아무도 몰랐다는 거다.
첫 번째가 Skitch(2011년 8월). 원래 호주 개발사 Plasq가 만든 Mac용 스크린샷·이미지 주석 앱으로, Mac 사용자들 사이에서 꽤 인지도가 있었다. 나도 꽤 많이 사용했다. Mac App Store에서 $20짜리로 팔리고 있었는데, Evernote가 사들이자마자 무료로 풀어버렸다. Libin은 “Evernote 빼고 내가 가장 많이 쓰는 앱”이라면서, 회사 사람들도 다 쓴다고 했다. 공동 창업자 Cris Pearson과 Keith Lang은 호주에서 미국으로 건너왔고, Libin은 “Skitch를 모든 곳에 넣겠다”고 선언했다.

같은 해에 Readable이라는 회사도 샀다. 이게 나중에 Evernote Clearly가 된다. 웹페이지에서 광고, 사이드바, 헤더 같은 잡다한 걸 다 걷어내고 본문만 깔끔하게 보여주는 리더 모드 확장 프로그램. 요즘으로 치면 Safari의 ‘읽기 도구’ 같은 거다.
Notable Meals라는 회사도 인수했는데, 이건 Evernote Food이 됐다. 그리고 Minds Momentum이라는 스타트업도 하나 더 샀다. 이건 할 일 관리 앱으로 변신할 예정이었다. Libin은 “인수는 엑싯을 시켜주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주려는 것”이라고 TechCrunch에 말했다. 4건 모두 1,000만 달러 이하의 주식·지분 거래였고, 2012년엔 인수를 더 늘리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실제로 2012년 5월, Penultimate을 만든 Cocoa Box를 인수했다. iPad용 필기 앱인데, 인수 당시 미국 App Store 역대 4번째로 많이 팔린 iPad 앱이었다. $0.99짜리 앱이 그 순위라는 건, 사용자 수가 어마어마했다는 뜻이다. Libin은 “디지털 필기가 드디어 제대로 된 시대가 왔다”며 흥분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나름 합리적인 전략처럼 보인다. Skitch의 주석 기능은 나중에 Web Clipper에 통합돼서, 스크린샷 찍고 화살표·텍스트·모자이크를 넣는 지금의 기능이 됐다. Clearly의 리더 모드도 Web Clipper의 “Simplified Article” 옵션으로 흡수됐다. Penultimate는 iPad에서 손글씨 메모를 Evernote에 바로 저장하는 통로가 됐다.
인수한 앱들이 본체에 녹아든 건 꽤 잘 된 편이었다(본체고 브라우저 확장이고 뒤룩뒤룩 살 찐건 차치하고).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아무도 안 쓴 자체 앱들
인수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체 개발 앱까지 마구 쏟아냈다. 전편에서 Moleskine 공책이나 Pfeiffer 액세서리 실패를 다뤘는데, 진짜 리소스 블랙홀은 앱 쪽이었다.
Evernote Peek(2011년)은 iPad 2의 Smart Cover를 이용한 퀴즈 앱이었다. 커버를 반쯤 열면 질문이 보이고, 완전히 열면 답이 나온다. 기발하긴 한데, 그걸로 끝. 한 번 써보고 “아, 신기하네” 하고 마는 물건.
Evernote Food(2011년)은 음식 사진이랑 레시피를 기록하는 앱. 인수한 Notable Meals을 바탕으로 만든 건데, 솔직히 메인 Evernote 앱으로 똑같은 걸 할 수 있었다. 굳이 왜 따로 만들었나 싶은 물건.
Evernote Hello(2011년)는 명함 관리 앱이었는데, NFC도 안 되고 명함 스캐너도 없었다. 정보를 전부 손으로 입력해야 했다. 이미 아이폰 초창기에 Bump라는 앱이 히트를 쳤었고, 게다가 2011년이면 CamCard 같은 앱들이 이미 OCR로 명함을 읽고 있던 시절인데, 수동 입력이라니.
이 앱들은 전부 2015년에 정리됐다. Peek, Hello는 2015년 2월에 단종. Food도 같은 해 9월에 사라졌다. Skitch도 Mac 버전만 남기고 iOS, Windows, Android 버전은 2016년 1월에 내렸다. Clearly도 같은 시기에 단종.
2011~2012년에 화려하게 사들이고 만들어놓은 앱 생태계가, 3~4년 만에 거의 다 접힌 거다.
여기에 2014년의 Work Chat(앱 내 메신저), 2018년의 Evernote Spaces(팀 협업)까지 합치면, 핵심 제품에 집중하지 못한 기간이 거의 7년이다. 한쪽에선 Skitch나 Penultimate 같은 괜찮은 앱을 돈 주고 사서 생태계를 넓히고, 다른 한쪽에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앱을 직접 만들어서 리소스를 태우고. “100년 기업”의 현실은 이런 모순 위에 서 있었다.
프라이버시 스캔들: 48시간의 참사
전편에서 이 사건을 한 줄로 넘겼는데, 사실 Evernote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신뢰 훼손 사건이었다.
2016년 12월 14일, Evernote가 새 프라이버시 정책을 발표했다. 머신러닝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일부 직원이 사용자 노트를 읽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 핵심은 거부가 안 된다는 거였다. 머신러닝 참여 자체는 끌 수 있었지만, 직원이 노트를 열람하는 것 자체를 막을 방법은 없었다.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트위터에 “disgraceful”, “abuse of trust”가 쏟아졌다. 한 기자는 “인터뷰 익명 소스 정보를 Evernote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지금 당장 전부 지우겠다”고 선언했다. CNN은 ‘당신의 데이터는 비공개가 아니라고 Evernote가 상기시켜 줬다’는 기사를 냈다.
CEO Chris O’Neill이 다음 날 해명에 나섰다. 실제로 읽는 건 극소수 직원뿐이고 개인 식별 정보는 가린다고. 소용없었다.
발표 이틀 만인 12월 16일, 전면 철회. O’Neill은 “고객들이 우리가 잘못했다고 확실히 알려줬다. 들었고, 바로잡겠다”고 했다. 머신러닝은 명시적 옵트인으로 바뀌었다.
48시간 만에 수습은 됐다. 그런데 “Your data is yours”를 내세우던 회사가, 직원한테 노트 열람 권한을 주겠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남긴 상처는 깊었다. Computerworld는 CEO 본인 입에서 나온 “messed up”을 그대로 헤드라인에 박았다. 장기 사용자 상당수가 이때부터 슬슬 대안을 찾기 시작했다. 대규모 이탈의 방아쇠였다.
한 달 만에 경영진 4명 퇴장
전편에서 Ian Small의 CEO 취임을 다루면서, 그 직전의 상황은 넘어갔었다. 2018년 여름은 Evernote 역사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다.
2018년 8~9월, 한 달 사이에 CTO Anirban Kundu, CFO Vincent Toolan, CPO Erik Wrobel, HR 총괄 Michelle Wagner가 줄줄이 나갔다. 그냥 이직이 아니다. 기술·재무·제품·인사를 맡는 C레벨 임원 4명이 동시에 빠진 거다.
Evernote는 밖에서 후임을 뽑는 대신, 입사한 지 몇 달 안 된 사람들의 역할을 늘리는 식으로 때웠다. 5월에 들어온 SVP가 CTO 역할을 떠안고, CMO가 제품까지 겸하고, 법무 담당자가 HR까지 맡았다. 빈자리를 메꾸는 게 아니라 돌려막기.
TechCrunch에 이걸 제보한 익명 관계자의 표현이 유명하다. “Evernote는 데스 스파이럴에 빠져 있다. 유료 사용자 성장과 활성 사용자 수가 6년째 제자리고, 기업용 제품은 시장에서 안 먹힌다.”
2주 뒤인 9월 18일, CEO Chris O’Neill이 54명 해고를 발표했다. 전체 인력의 15%. 직원 메모에선 “올해 20% 넘게 성장했고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같은 시기에 프리미엄 구독료를 $70에서 $42로 급하게 할인한 건 그 말의 신빙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행동이었다.
Evernote가 마지막으로 대규모 외부 투자를 받은 건 2013년의 600만 달러 메자닌 라운드(PitchBook 기준)다. 3억 달러 가까이 끌어모은 회사가, 그 이후 5년간 투자 한 건 없었다는 얘기.
v10: 기존 사용자를 밀어낸 업데이트
전편에서 빠진 사건 하나 더. 2020년 말, Evernote가 데스크톱 앱을 Electron 프레임워크로 처음부터 새로 썼다. v10. 목표는 Windows, macOS, 모바일, 웹 전부에서 같은 경험을 주겠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처참했다.
사용자 포럼에 누락된 기능 목록을 정리하는 스레드가 생겼는데, 수십 페이지로 불어났다. 인쇄 미리보기 삭제, 암호화된 노트 편집 불가, AppleScript 지원 제거, 로컬 노트북 폐지, HTML 내보내기 삭제, 태그 계층 미지원. 터키어·라트비아어·폴란드어 키보드 레이아웃에서는 단축키 충돌로 아예 타이핑이 안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Electron에서 감 잡은 사람들이 많겠지만) 앱이 구버전보다 눈에 띄게 느려졌다.
한 사용자는 “10년간 공들여 쌓은 태그 계층 구조가 통째로 날아갔는데, 안내 한 줄 없었다”고 적었다. 다른 사용자는 “v10에서 깨졌거나 사라진 20가지 기능”이라는 글을 올리면서 이별을 선언했다.
통일된 코드베이스라는 기술적 목표 자체는 말이 됐다. 그런데 기존 사용자가 매일 쓰던 기능을 대거 날리면서, 그만한 새 가치는 안 줬다. Notion이랑 Obsidian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사람을 끌어오는 판에, Evernote는 남아있던 사용자마저 밀어내는 업데이트를 한 셈이다. 비단 Notion이나 Obsidian 뿐 아니라, 세상 천지에 노트 앱들이 널려 있었고, 이들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공론화 노트: 한국에서만 벌어진 일
Evernote의 몰락을 다루면서 빼놓으면 좀 아쉬운 게, 한국에서의 독특한 쓰임새다. 한국 사용자들은 에버노트를 노트 앱이 아니라 대자보 플랫폼으로 썼다.
배경은 이렇다. 한국 트위터(현 X) 문화에서는 누군가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거나, 논란에 대해 해명·사과하는 장문의 글을 올리는 걸 ‘공론화’라고 부른다. 문제는 트윗 한 건의 글자 수 제한이 140자라는 거다. 장문의 폭로글이나 사과문을 쓸 수가 없으니, 사람들이 찾은 우회로가 에버노트였다. 노트에 글을 길게 쓰고, 퍼블릭 링크를 뽑아서 트위터에 공유하는 방식.
이게 너무 정착되다 보니 아예 관용구가 됐다. 나무위키 ‘에버노트’ 항목에 따르면, “에버노트를 받다” = “공론화를 당하다”, “에버노트를 쓰다” = “공론화하다” 또는 “사과문을 쓰다”라는 등식이 생겼다. “인장 검은색으로 바꾸고 에버노트 준비해라”는 식의 조롱까지 돌았다. 에버노트에 퍼블릭 링크 기능이 있다는 걸, 남의 사과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야 처음 알게 된 사람도 많았다.
주로 동인·코스프레·팬덤 커뮤니티에서 활발했는데, 솔직히 대부분은 개인 간 감정 싸움이었다. 그림 표절 시비, 동인 행사 트러블, 커미션 분쟁. 커뮤니티에서는 “에버노트 공론화 80%가 지들끼리 싸운 글”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공론화해서 해결된 사건이 몇 개나 되냐”는 자조 섞인 비판도 있었고.
에버노트 입장에서 보면 좀 기묘한 상황이다. 실리콘밸리에서 “생산성의 미래”를 꿈꾸던 앱이, 한국에서는 트위터 폭로전의 필수 도구로 자리잡은 거니까. 에버노트가 의도한 유즈케이스 어디에도 “SNS 대자보”는 없었을 텐데.
그마저도 오래가진 못했다. 에버노트 무료 플랜이 계속 깎이면서 접근성이 떨어졌고, 사람들은 구글 독스나 비캔버스 같은 대안으로 옮겨갔다. 트위터 자체도 X로 바뀌면서 글자 수 제한이 완화됐다. “공론화 = 에버노트”라는 공식은 2019~2020년쯤을 정점으로 서서히 희미해졌다.
전 세계적으로는 “노트 앱”으로 쓰이다가 Notion에 밀렸고, 한국에서는 “대자보 앱”으로 쓰이다가 구글 독스에 밀린 셈이다. 어디서든 대체당했다는 결론은 같은데, 대체당한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는 게 흥미롭다.
숫자가 말해주는 것
전편에서 다 못 다룬 핵심 수치들을 정리해보면 이런 그림이 나온다.
Evernote 등록 사용자는 2008년 50만에서 2015년 1억 5천만까지 폭발적으로 늘었다. 그런데 ‘가입한 사람’이랑 ‘매일 쓰는 사람’은 전혀 다른 얘기다. 2018년 내부 제보자 말대로 유료·활성 사용자 성장은 6년째 정체. 2억 5천만 명이 가입했지만, 실제로 꾸준히 여는 사람은 갈수록 줄었다.
한때 생산성 앱 1위이던 Evernote의 App Store 순위는 2018년에 55위까지 떨어졌고, 전체 앱 순위에 이름을 올릴 만한 다운로드 수도 못 채우게 됐다. 연 다운로드는 2017년 약 960만 건이 정점이었고, 이후로 계속 내리막을 찍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 쓰는 Sean Ellis 테스트라는 게 있다. “이 제품을 더 이상 못 쓰게 되면 어떨 것 같냐”고 물어서, “매우 실망”이라고 답한 비율이 40% 넘으면 product-market fit(PMF)이 있다고 본다. Evernote는 이 수치가 공개 된 적이 없다, 다만 6년째 성장이 멈추고 무료 사용자 대부분이 유료 전환 없이 빠져나간 상황에서 이 점수가 40%를 밑돌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많았다.
즉, 2억 5천만 가입의 이면에는, 대다수가 “한번 깔아보고 지운 사람”이라는 불편한 현실이 있었다.
닫는 생각
전편이 큰 그림이었다면, 이번 글은 그 사이사이의 빈칸을 채우려 했다. 새벽 3시 10분의 구원 메일, 2011년 인수 행각에서 자체 앱 난립까지, 한국에서의 변칙적인 인기와 48시간짜리 프라이버시 참사, 한 달 만의 경영진 총퇴장, v10의 자충수.
쭉 놓고 보면 패턴이 보인다. Evernote는 한 방에 무너진 게 아니다. 작은 균열이 겹겹이 쌓인 과정이었다. 사이드 프로젝트로 집중력을 잃고, 프라이버시 스캔들로 신뢰를 깎고, 경영진 이탈로 방향을 잃고, v10으로 남은 사용자마저 밀어내고, 마지막에 새 주인이 남은 것까지 쥐어짜는 순서.
하나 씁쓸한 대비가 있다. 2008년, 스웨덴의 한 사용자는 제품이 좋아서 50만 달러를 보냈다. 2024년, Evernote의 새 주인은 바로 그런 사용자들한테 데이터를 볼모로 가격을 두 배로 올렸다. “Your data is yours”에서 “돈 내든지 데이터 잃든지”로. 회사는 같은 이름인데,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