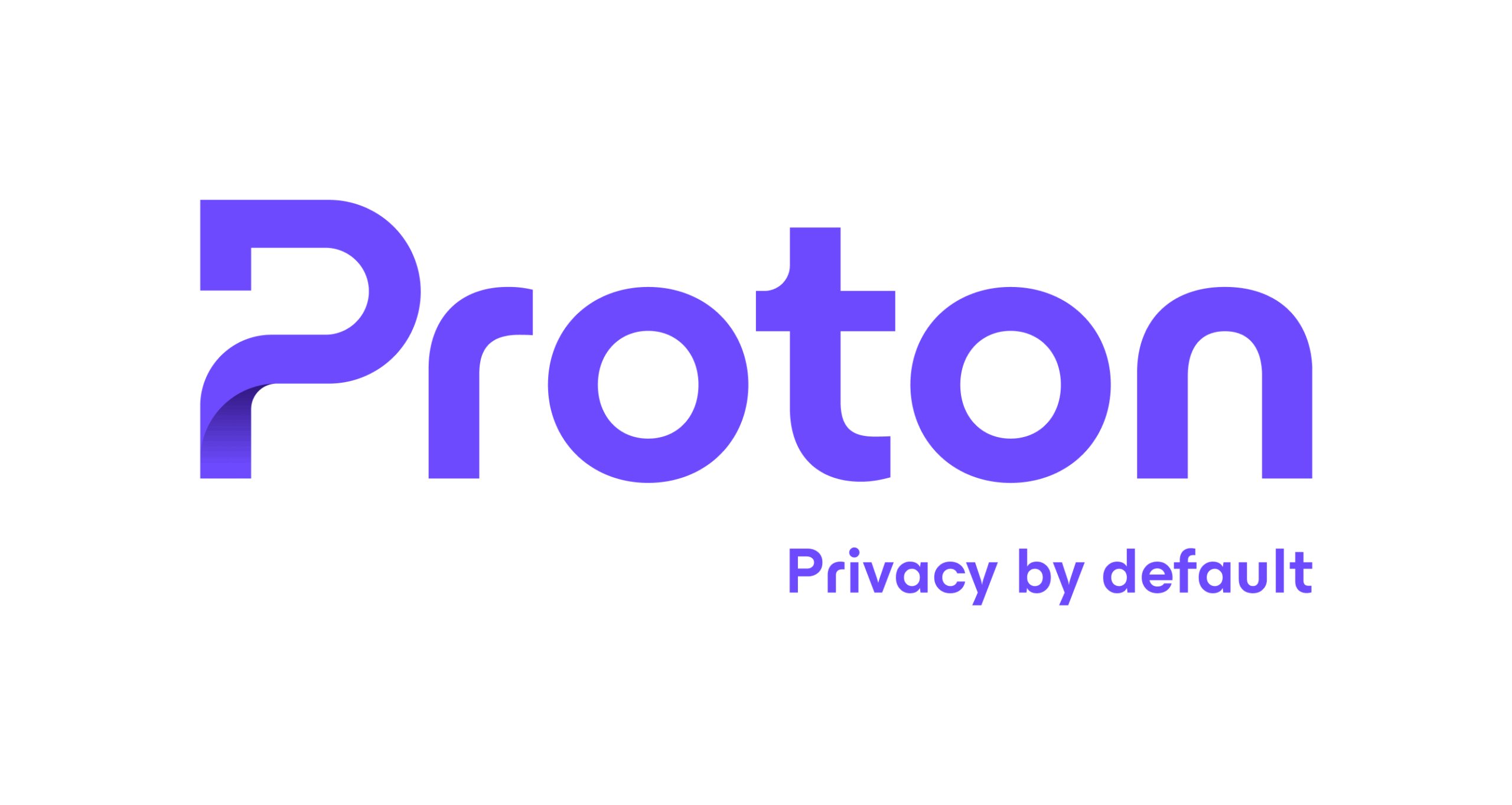2004년 11월 26일 금요일. 비가 내리다.
비가 내리면 커피가 그립다. 음악이 흐르고 손에 따뜻한 커피컵의 감촉이 느껴지고, 복잡할때는 앉기 힘든 푹신한 벨벳 훼브릭 소파에 앉아서 사색하며 윤활유로 커피 한두어잔 부어주는 것은 형용할 수 없는 만족감을 준다.
비내리는 오전의 스타벅스는 한산하다. 잘 생긴 바티스타가 홀로 분주히 재고를 정리하는 모습만이 간간히 눈에 뜨일 뿐이다.
이틀전이 생각난다. 이틀전 탔던 엘리베이터, 이틀전 왔던 바로 그 장소이지만 나에게 말을 걸어줄 벗은 없다. 홀로 쓸쓸히 아침으로 커피와 패스츄리를 들기가 너무나 싫어 가방에서 공책과 펜을 든다. 누군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이 없어, 나 스스로의 모노로그를 적는다.
비가 부슬부슬 내려 날이 추워 따뜻한 커피를 같이 마시면서 김을 호호 불며 웃어줄 벗이 없다는 건 또 슬픈일이다. 특히 짝사랑하는 이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무의식적으로 두잔의 커피와 패스츄리를 주문하려다 캔슬하는 것도 아무도 앉지 않은 맞은 편의 빈자리도. 더욱 쓸쓸하게 한다. 지윤이에게 메시지를 보낸다. 언제 끝나냐고… 답장이 없다.
딱딱한 브라우니를 한입 앙 물고 사진을 두어 방 찍고 있자니 사람들이 제법 늘어난다. 메시지가 왔다 답장을 쓴다.
와달라고, 사람이 그리워서… 와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