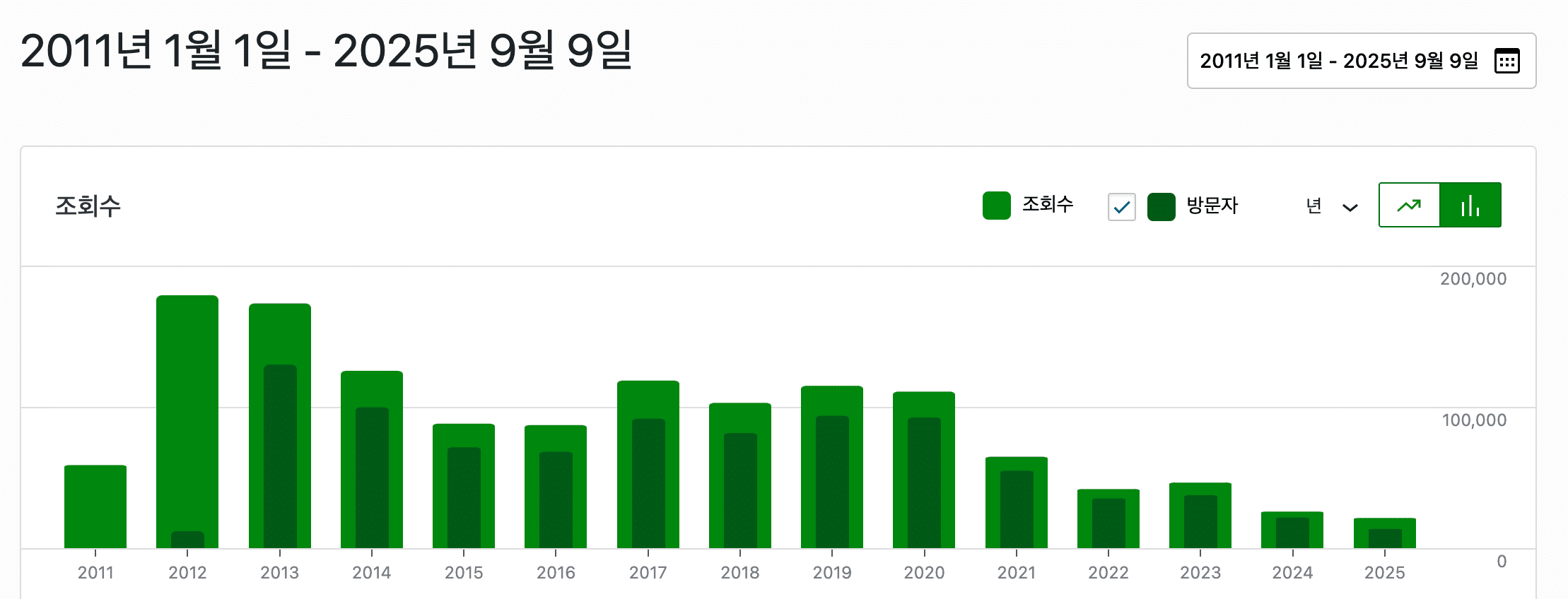드라마 House M.D.를 보면 휴 로리가 연기한 그레고리 하우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환자를 직접 보는 일을 극도로 꺼리면서도, 날카롭고 가시 돋힌 말로 팀원들을 들들 볶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단순한 잔소리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비판적 통찰이고, 결국 환자를 치료로 이끄는 열쇠가 되지요. 치료의 손길은 팀원들이지만, 하우스의 질문과 비판이 극의 핵심을 이룹니다.
저에게 있어 AI 챗봇과 글을 쓰는 과정은 바로 그런 장면과 닮아 있습니다. 글을 단순히 대신 써주는 존재라기보다는, 사고를 던지고 다시 받아내는 캐치볼 같은 존재에 가깝습니다.
“유기농 글”에 대한 아쉬움
솔직히 AI와 함께 글을 쓰다 보면 “이건 유기농 글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스치기도 합니다. 마치 첨가물이 들어간 듯, 손끝에서 직접 태어난 글이 아니라는 부끄러움 말입니다. 하지만 곰곰이 따져보면, 글의 가치는 그것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쓰였는가보다, 얼마나 의미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그것을 다듬고 제 생각을 보태는 과정에서 오히려 새로운 통찰과 표현이 생겨납니다. 즉, 중요한 건 “출발이 어디서였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이끌렸느냐”일 것입니다.
AI 활용에 대한 태도
저는 AI 활용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영하는 편입니다. AI는 단순한 편집기나 검색 도구를 넘어서, 비판적 대화 상대이자 사고 확장의 파트너가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 글을 쓰다 막힐 때 새로운 각도를 보여주고,
- 지나치게 감정적일 때 균형을 잡아주며,
-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구조나 표현을 제안합니다.
이건 마치 하우스가 팀원들을 몰아붙이듯, 제 생각을 흔들고 다듬어주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동료
결국 중요한 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AI가 대신 글을 써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함께 사고의 공을 주고받으며 글을 빚어내는 것입니다. 독자에게 가치를 전하는 글이라면, 그것이 “유기농”이든 “AI 보조”든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이 과정을 통해 더 풍성한 글을 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마치 하우스 팀이 각자의 역할을 다해 환자를 살리듯, 저 역시 AI와 함께 글을 통해 생각을 살려내고 있습니다.
예, 이 글은 AI가 거들어 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