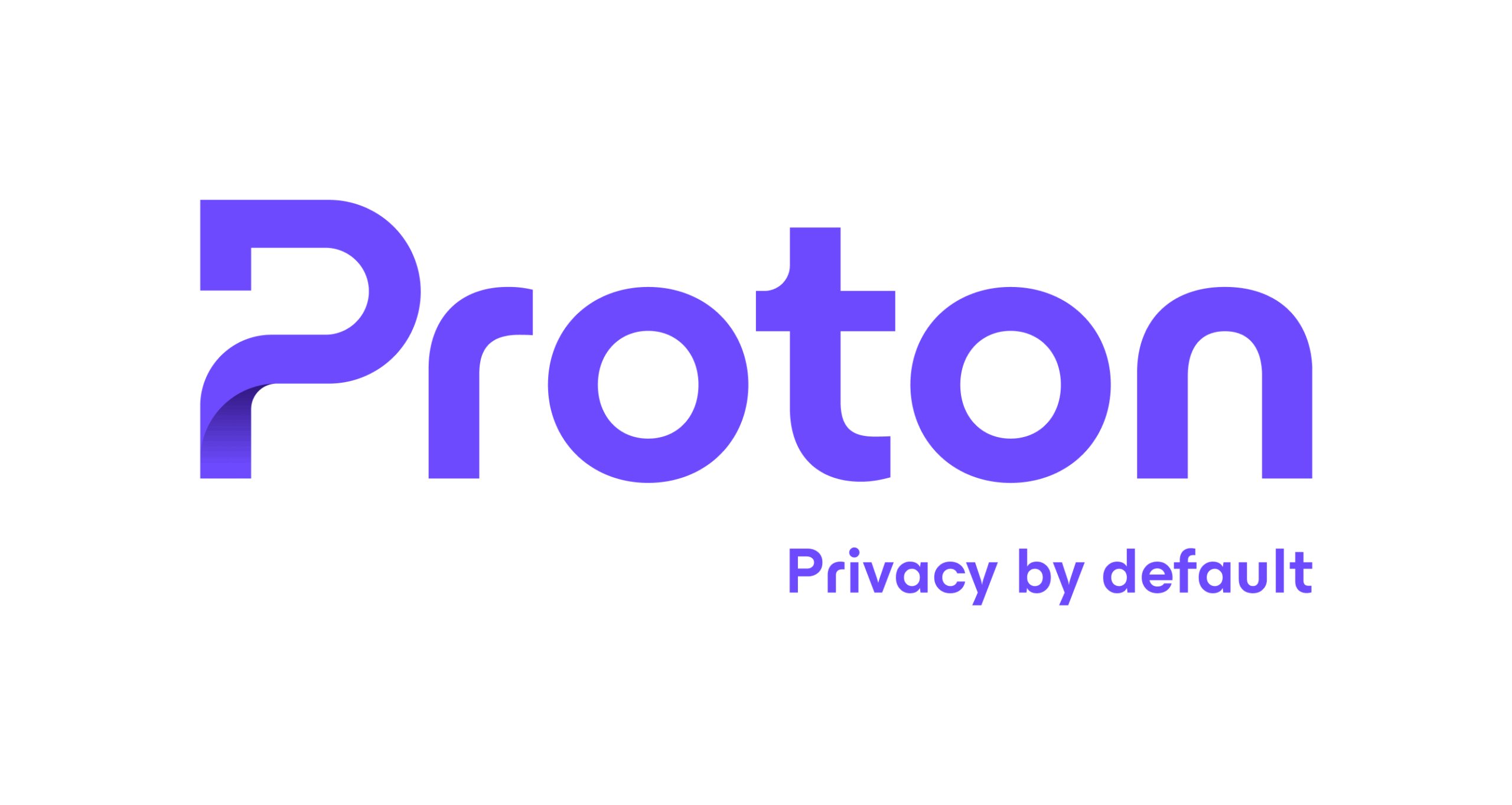일전에 한번 전자여권이 나온다길래 한번 해외여행자유화 이래로 크게 변한게 없는 여권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 싶어서 친구 준영이와 공동작업을 한적이 있었다. 물론 그걸 하고 나서 정부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고 공모를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퀄리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공을 들인것이다.
뭐 우리의 무사안일 공무원 나으리는 결국 기존 여권에 바이오메트릭 마크만 박은 ‘보수적’노선을 택하고 마셨다. 물론 그 디자인을 따랐으면 좋았겠지만 단색 기름종이에 비해 그 화려한 디자인들은 한마디로 ‘쩐’이 많이 든다. 사실 공모전에 붙은 여권을 보면서 놀라긴 했지만 현실성은 이쪽이 더 나았다. 기왕 컬러를 넣는다면 색이 적고 단순한 쪽이 코스트가 적게 먹는다.
현행 자동차 번호판, 사실 임시변통이었다는 것을 아시는지, 정부에서는 유럽식 넘버플레이트와 함께 형광 필름을 도입하기로 했다. 시인성도 좋고 청색 계열 띠도 두를 수 있어서 디자인도 좋았다. 역시 이것도 비용문제로 인해 당분간은 페인트 번호판이 사용될 것이다.
디자인이라는건 이래서 골치 아프다. 신문에서 읽었던 기억으로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를 지었던 사람은 자신은 디자인을 했으니 짓는건 당신들 몫이라는 소리를 했지만, 그건 그런 물건을 생각해낸 ‘짤’이 있는 사람이나 할 소리지. 9할의 범인들은 당연히 엔지니어링이나 경영에도 조예가 있어야 한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겠지만, 디자인이 돈이나 기술에 얽메이게 되면 창의력의 발산이 저해되고 결국 진보의 정체를 낳을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인 타협을 통해서 양산되어 확산된다면 비록 돈이나 기술의 프레임에 갖혀있을지언정 전체적인 삶은 진보한다. 어떤것이 낫다고 하기 어렵다.
오히려 두가지 큰 공공 디자인의 제자리걸음을 보면 후자가 더 중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