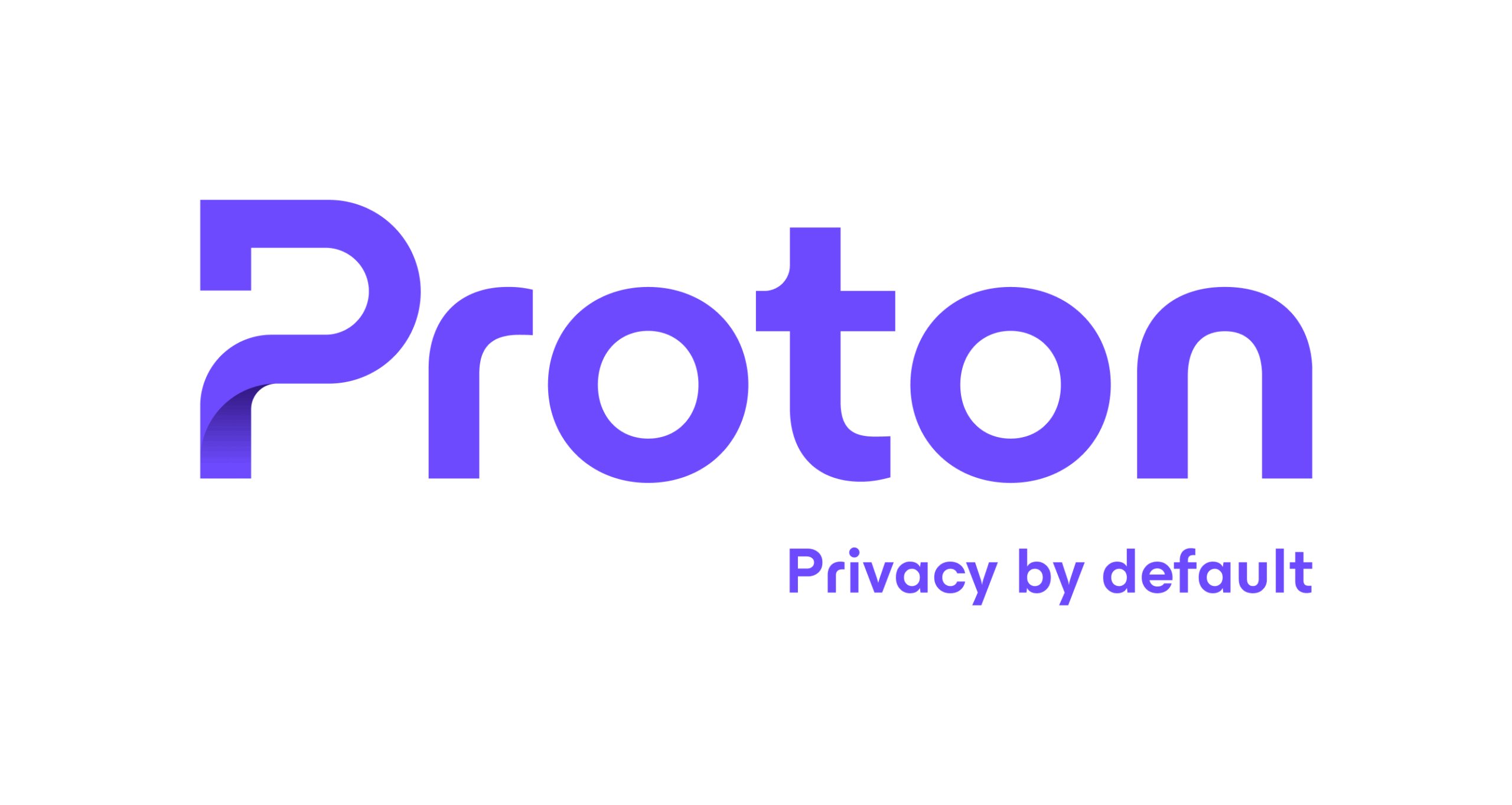또다시 병원에 실려갔다. 분하다 어떨땐. 열심히 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때가 많다. 낑낑거리면서 따라와도 알아주긴 커녕, 아랑곳없이 할일을 더 늘려주는 고마움을 베풀뿐이다. 얼마전에 ‘일 리터의 눈물’을 읽다가 관두었다. 드라마를 통해서 얼추 결말을 알고 있는데 고통받는 모습을 보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가학욕을 채우는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이다(아니 어쩌면 그 결말만큼은 피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유감스럽게도 책과는 달리 사람 사는데 있어서 책장 덮어 다시 서가에 꽂듯이 편리하게 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듯하다. 하지만 내가 내용을 채워 넣을 수는 있다. 물론 이게 쉽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상상을 초월한다. 남들 두명어치의 몸을 움직이려면, 남들 두명어치의 힘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일 뿐이다. 그래서 힘들때 분하다. 더 잘해야하는때에 분하다. 덕분에 나약해져서 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