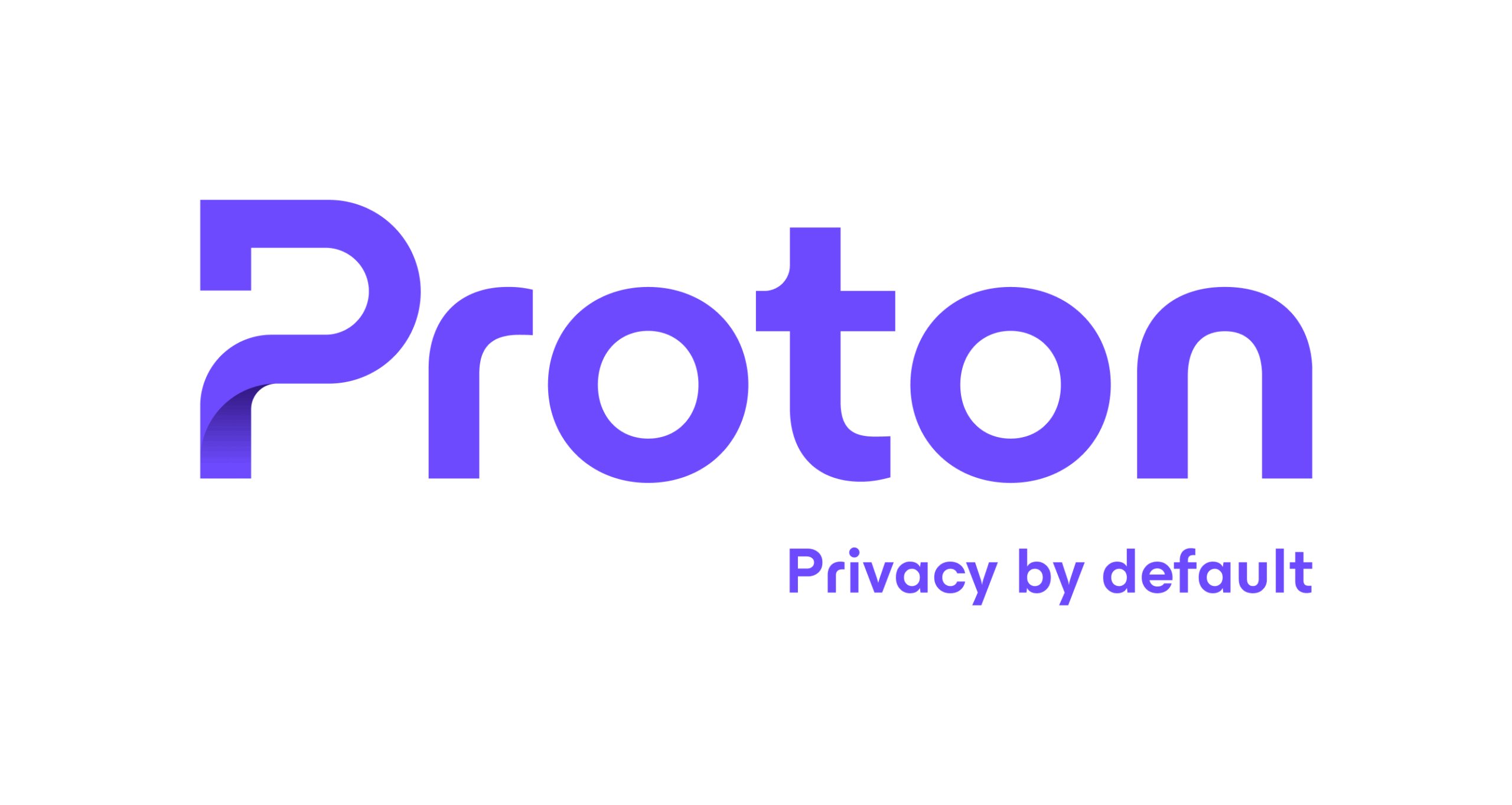사실 저는 노트북에 터치스크린을 넣는것이 괜찮은 아이디어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있으면 쓸데도 생기기 마련이라 없는것보다 나을지도 모르지만 굳이 넣어야 하는가? 라고 하면 글쎄요?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맥북프로와 함께 사용하는 윈도우 노트북 PC는 레노버의 ThinkPad X1 Yoga입니다. 터치패널이 탑재된 소위 말하는 2 in 1 컨버터블 타입의 기종으로 터치패널과 펜이 있습니다. 2016년 봄에 사서 그럭저럭 고맙게도 잘 썼습니다만 펜과 터치패널을 주 포인팅 디바이스로 쓴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요번에 어머니가 잠시 집에 오셨는데, 어머니는 pooq이나 tving, 심지어 Netflix 같은 서비스에서 동영상을 돌려보시는걸 좋아하십니다. 계시는 동안 싱크패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는데 당신께서 마우스는 물론 터치패드도 사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면을 터치해서 스크롤하거나 선택이 가능하다는걸 알게 되시자 적극적으로 화면을 누르시고 온스크린 키보드를 사용하시더군요. 윈도우와 크롬, 그리고 이들 웹사이트들이 터치에 완전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감안해도 상당히 자연스럽게 쓰시더군요. 여쭤보니 ‘휴대폰을 쓰는 감각으로 쓸 수 있어서 좋았다.’ 라고 하시더군요. 약간 허를 찔렸다고 할까요.
사실 애플과 애플의 ‘입’인 필 실러는 기회과 될 때마다 터치스크린이 달린 맥이나 마우스가 달린 iPad를 부정하고 있죠. 요는 그겁니다. 최적화된 경험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아이패드와 맥이 서로 잡아먹는, 즉 카니발라이제이션(carnivalization)을 우려하는 것이라는 것이 정답이겠지만 말입니다.
지난번에 인용했던 더 인디펜던트의 2016년 기사(현행 폼팩터의 맥북프로가 첫 출시된 직후)에서 필 실러는 ‘Hey Siri’가 ‘저전력으로 움직이는 시스템 전반 레벨에서 적절하게 돌아가는 전자 장비가 필요’하다며 현행 맥에는 그런게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우리는 맥북프로에서 Hey Siri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말한 시스템 전반을 관리하는 새로운 T2 칩 덕택이죠.
그러니 지금은 무슨무슨 이유로 어렵습니다라고 할지라도 혹시 압니까. 소문대로 ARM 맥을 만드는 겸사겸사 터치패널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궁리하면서 “지금까지 터치패널을 부정한건 적절한 인터페이스적인 답이 없었기 때문이지만 이젠 찾았다”라고 능청을 떨지도 모르는 노릇이지요.
좌우간 그게 윈도우던 맥OS이던 간에 아직까지는 데스크톱 파생 OS가 터치 하기에 알맞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현재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