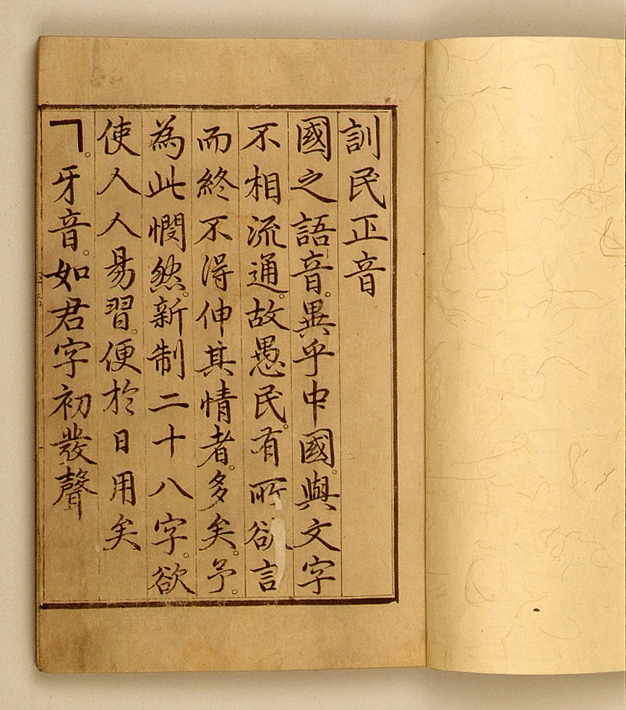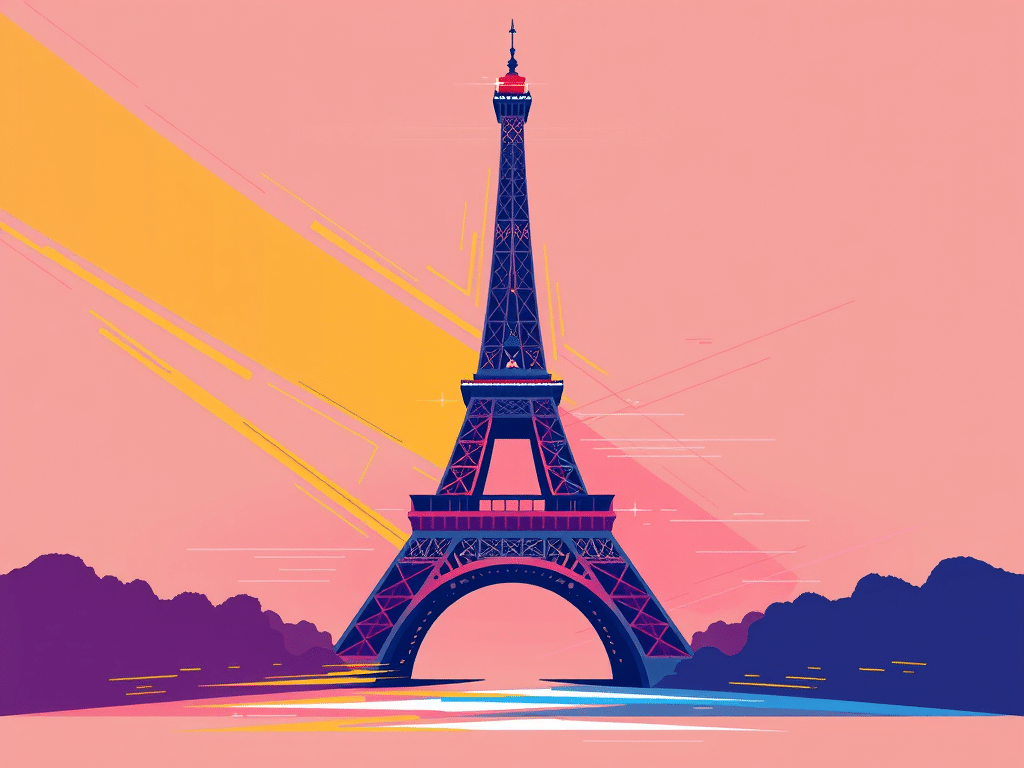2016년 한국은 헬조선이라고 불리지만 어떤 의미에서 정말로 살기 좋은 나라이다.
이 웃기는 동영상에서 ‘영국남자’와 맥도날드에서 일해본 적이 있다는 ‘신부님’은 자정 가까운 시간에 맥도날드가 자정 가까운 시간에 문앞까지 햄버거를 배달해준다는 사실에 놀란다. 물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젊은 노동자들의 야간 노동이 따라오는건 기본이다.
사실 전화 한 통, 앱 터치 몇 번이면 집에 틀어박혀서 사는 것도 문제가 없는게 2016년의 한국이다. 생필품을 주문할 수도 있고 24시간 언제든 음식을 주문할 수도 있다. 트위터에서 나는 하겐다즈에 반쯤 미친 녀석으로 통하는데, 그 하겐다즈를 사기 위해서 몇백미터 떨어진 편의점이 가기 싫어도 탭을 몇번하면 마트에서 하겐다즈를 배달해준다.
나는 여기에서 2016년의 슬픈 노동 현실에 대해서 논할 생각은 아니다. 그러기에는 나는 죄송스러울 정도로 운이 좋은 편이다. 뭐가 되든 말만 아름다운 공치사가 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좀 피상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저 한다. 2016년의 한국에서 내가 겪은 두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스스로 뭔가 생각에 빠지고 싶었을 뿐이다.
오픈마켓에서 물건을 샀을때 일이다. 늘 하듯이 물건의 리스트를 보고 최저가를 찾아본다, 정식 수입품이 아닌 것 같은 함정을 제거하고, 배송료 장난을 제거하고 대략 이게 좋아보인다 싶어서 결정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다. 배송이 늦어지거나, 재고가 없거나, 제품에 문제가 있을때 트러블이 생긴다. 보통 이럴 경우 판매자와 연락을 하면 판매자가 직접 응하는게 일반적인 일이다. “아 그게 문제가 있군요. 다시 보내드리죠” 라던가 “그건 지금 준비중이니 언제 발송 됩니다”라던가. 그런데 최근 겪은 ‘최저가’ 판매자들에게서는 이상한 기척이 느껴진다. 전화를 받는 사람이 따로 있고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느낌이다.
물론 전화를 받는 사람이 물건을 받으리라는 법은 없다. 용산의 유명한 컴퓨터 관련 판매 업체만 하더라도 배송을 하는 쪽과 가게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은 다르고, 출고를 담당하는 사람은 따로 있을테니까. 하지만 이건 그런 수준이 아니다. 아예 별개의 ‘자연인’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다. 물건이 다른 종류로 오발송 됐다. 6mm 폭의 수정테이프가 세 개 와야할 것이 6mm 대신에 5mm짜리가 하나 섞여 왔다. 송장으로 연락을 해보니 자신들은 모르니 다른 번호를 알려주고 그쪽에서 다시 발송하는 곳으로 알아보겠다고 하고 몇시간 뒤에 물건의 상황에 대해 판단이 선 모양이다. 결과적으로 6mm짜리는 재고가 2개밖에 없었고(틀림없이 웹사이트에는 그렇지 않았다), 결국 5mm 테이프를 돌려주고 그 값을 환불 받았다. 다만 이 과정에서 환불 송장의 주소는 판매자의 주소였으나 실제로 물건이 가야 했을 주소는 물건을 보내는 사람의 주소여야 했다. 저쪽도 나도 서로 짜증을 내다 누가 먼저랄것도 없이 포기했다. 나도 오픈 마켓도 그것을 알 턱이 없다. 비싸더라도 거래하던 문구 전문 사이트에서 주문할걸 후회했다.
마우스를 하나 샀다. 로지텍의 애니웨어 마우스의 후속 제품인데 평소대로 저렴한 업체를 골라서 주문을 했다. 도착은 제대로 했고 충전을 하려고 하니 충전이 안된다. 보아하니 안쪽의 충전 핀이 휘어 있는게 걸린다. 이미 주말이라 전화를 해도 안받고 결국 오픈마켓의 교환 버튼을 눌러서 택배 예약을 했다. 그리고 이래 저래 지연되서 물건을 돌려주고 다시 물건을 받았는데 그 도중에 판매자와 물건을 보내는 쪽이 또 다르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찌됐든 연락이 되서 중간 상황을 확인하긴 했는데, ‘물건은 받았지만 그것을 확인하는 것은 다른 곳’이라는 송장의 사람과, ‘거기에 도착을 해도 반영이 되는것은 18시 이후’라는 판매자. 그래서 광복절 연휴 이전에는 받아볼 수 있겠냐고 하니 그럴것 같다고 했고, 물건은 토요일에 받았다. 아무런 완충포장 없이 상자만 봉투에 집어넣어서 보낸 마우스를. 나는 이걸 어떻게 해야하나 현재 고민 중에 있다. 아마 앞서 언급한 컴퓨터 업체에 주문을 하면 최소한 이런 비상식적인 포장은 안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든다. 돈은 좀 더 들었을지언정.
나는 KFC나 도미노 피자 같은 프랜차이즈가 아니면 온라인 음식 배달 앱을 사용하지 않는다. 사실 음식의 때깔을 속이는 것은 전단지 책자나 냉장고 자석 메뉴판 때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하지만 동네에서 음식을 파는 사람은 동네 장사고 내가 이 번호로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배달을 하는 사람도 동네사람이다. 하지만 배달 앱으로 주문을 하면 같은 도시에서 인생의 95%를 살았음에도 차를 타면서 지나나 가봤나 싶은 곳에서 전화나 앱을 통한 주문을 받아서 주문을 넘기면 또 어디에 쳐박혀 있는지 모르는 업체에서 음식이 만들어져서 배달을 하는 것도 배달 전문 업체에서 한다. 배달 대행도 수수료가 있을 것이고 주문을 받는데도 수수료가 들 것이다. 그리고 그걸 앱에 띄우는데도 돈이 든다. 결국 내가 내는 음식값은 결국 음식이 아니라 그 사이에 낀 사람들에게 상당수가 떨어지게 된다. 당연히 맛대가리가 없다.
되도록이면 야식집은 이용을 안하는데 그 이유가 사실 이런 것이었다. 야식은 예전부터 기업형으로 운영됐고, 공장식 주방의 음식이었다. 병원을 가기 위해서 차를 타고 가다가 족히 택시로 5~6000원 거리에 있는 곳에서 음식이 내가 아는 야식집의 조리 장소라는 것을 알고 그 이후로는 주문을 하지 않았다. 그치만 하다 못해 음식에 비해 터무니 없이 비싼 값을 받았을지언정 자기네 상호를 걸고 만들어 배달을 했다는 사실은 말해두고 싶다. 차라리 이게 낫다.
편리해지고 빨라지고 언제나 먹을 수 있다. 마우스를 버튼 한번에 싸게 주문 할 수 있다. 이런 사이에 점점 하청에 하청이 생기고 있었다. 우리가 보통 하청을 얘기를 하면 집을 짓거나, 배를 짓거나, 공장을 짓거나, 반도체를 만들거나, 뭐 여하튼 뭔가 엄청난 일에 있다고 생각하기 십상이지만 결국 끼니에 몇천원짜리 음식을 하나 시켜먹고 2~3000원짜리 수정 테이프를 사거나 몇 만원짜리 마우스를 사면서도 우리는 다단계 하청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필경 직접 재고를 떠안고 관리하지 않으면, 배달할 사람을 고용하고 보험들어주지 않으면, 더 싼 가격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결과로 남은게 맛대가리 없어서 쓰레기통으로 간 식사와 찌그러진 마우스 상자와 그 마우스를 받기 위해 낭비한 일주일이다.
도처에 하청이 있고 도처에 쉬운돈을 바라는 사람이 있다. 최저가와 편리함을 쫓던 나도 어떻게 보면 공범자다. 이후로는 음식은 전단지 보고 동네 식당에 주문하고 있다, 마우스는 글쎄 이거 참 난감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뜯어서 문제 없으면 쓸지 아니면 갸릉 거릴지. 구분할 방법이 없으니 곤란하다. 뭐 다만 어느 정도 알게 된 사실이 있다. 내가 트위터에서 말한 유명한 대사가 있다.
비싼 물건이 비싼 이유를 모두 논리적으로 설명하는건 불가능하지만 싼 물건이 싼 이유는 반드시 설명이 가능하다. 24시간 언제든 탭 몇번에 달려오는 음식에는 분명 어딘가에 보이지 않는 가격표와 대가가 붙어 있다. 그것이 오롯이 나한테 비싼 음식값으로 전가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만드는 사람에게 전가되서 형편없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을 배달하는 사람에게 전가 될 수도 있다. 늦은 시간에 물건을 받아서 하나라도 빨리 가져다 주는 식으로 ‘일건낙착’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서 도로에서 험하게 운전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곧잘 보는데, 오토바이 운전을 하는 배달부의 ‘목숨’으로 전가 되는지도 모른다.
트위터에서 듀나를 곧잘 보는데 그 듀나가 90년대 하우PC에 연재했던 컬럼, 이제는 내용도 기억은 안나는데 제목은 기억이 난다. 뭐 나중에 영어를 공부하면서 서양에서는 으레 쓰이는 표현이라는걸 알게 된 까닭도 있다.
“공짜 점심은 없다(There’s no such things as a free lun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