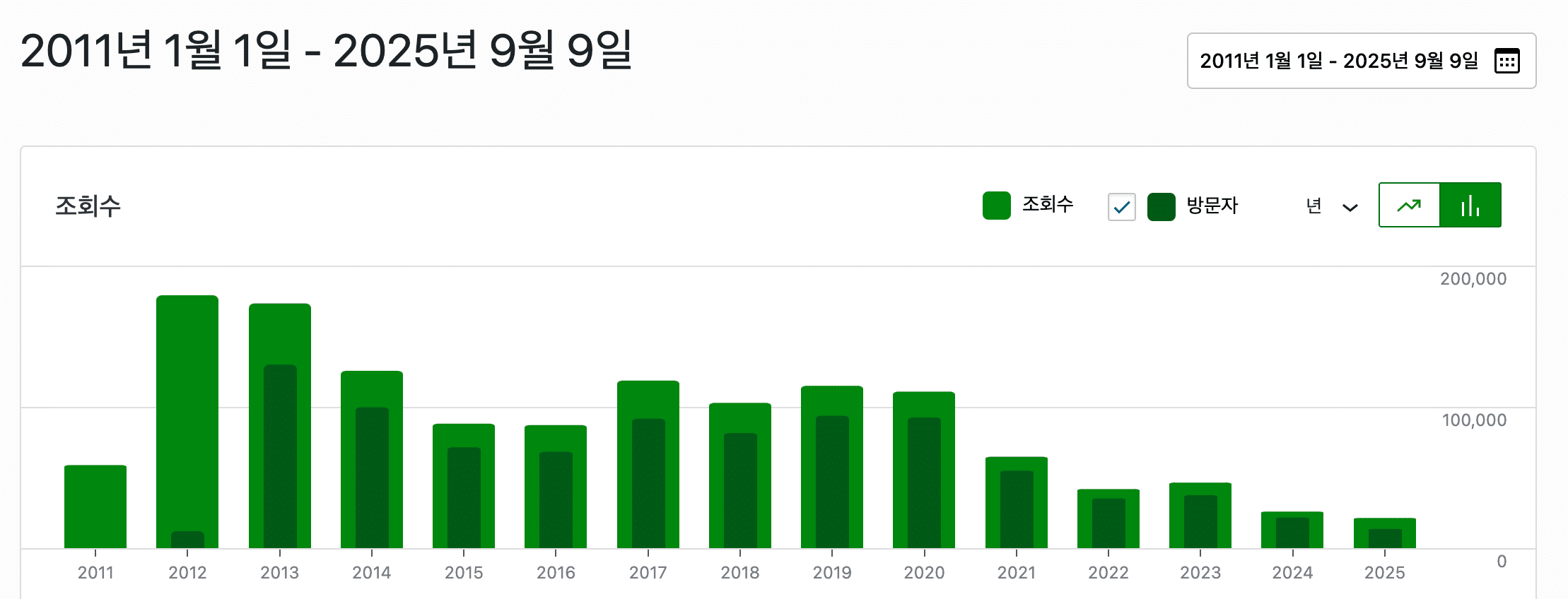지금 나는 데스크톱이냐 노트북이냐로 고민중이다. 이건 아마도 7년 만의 고민일 것이다.
우리 집은 가구원 수에 비해 꽤 큰 편이다. 결코 절대적으로 큰 집은 아니지만 혼자서 방 세칸 짜리 집을 차지하고 있다면 아마도 혼자서 쓰기에 작은 편은 결코 아닌 셈이라고 생각한다. 그 중에서 하나가 내 방인데 사실 온 집안을 내 세간살림으로 도배하고 있지만서도 특히 오만 잡동사니로 도배되어 있고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이 방은 정말로 내가 말하기 뭐하다만 정리정돈과는 크게 거리가 멀다(손님이, 특히 방까지 들이는 손님이 적은게 다행이라 생각한다). 특히 책상에는 어마어마한 잡동사니, 책자와 문방구, 일력과 달력 등이 뒹구는데 거의 뭐 책상 본연의 작업공간이라기 보다는 거대한 수납공간이다.
나도 언제까지나 이랬던건 아니어서 몸이 좋았을때는 데스크톱을 썼었는데 언젠가부터 노트북으로 완전히 갈아탔고 노트북을 침대나 소파위에서 사용하는게 익숙해지자 데스크톱을 쓰지 않게 되었다. 뭐 나도 한때는 컴퓨터를 조립해서 쓰고 수리를 하고 (지금 내 행적으로 볼때 그다지 믿기지 않겠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MCP에 도전해서 취득했던 나였으니, 성능이 더 높은 데스크톱 컴퓨터나 조립PC, 그리고 큰 화면의 모니터 등에 동경하던 때도 있었더랬다. 그래도 일단은 나는 ‘노트북이 편해’ 파였다. 박스에서 꺼내서 전원을 넣고 침대 위에서 작업하다가 덮개를 덮어서 구석에 치워놓고 잠드는. (뭐 작업공간과 침실이 구별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불면증 치료의 제1원칙 따위는 잊어버린지 오래였다)
마지막으로 사용한 데스크톱이 iMac(Early 2006 20")이었는데 이번에 차례로 21"와 27" 아이맥을 돌아가며 사용하게 되었다. 잠이 덜깬 상태로 컴퓨터가 온다는 전화를 받았을때, ‘아. 이거 골 아프겠구만…’ 싶었다. 일단 책상을 좀 치워 워크스페이스를 마련했다. 대강 어느정도 풋프린트(footprint)를 차지할 것인지 예상이 서지 않았다. 박스를 보니 진짜로 골이 아팠다. 아이맥 20" 시절에 비하면 확실히 포장이 간소화되었다고는 하나 여전히 위압감 넘치는 21" 아이맥이었다. 거실 마루 바닥에 놓은 상자에 테이프를 풀고 스티로폼을 열고 낑낑 거리며 본체를 들어 올린 다음 보호 덮개를 치우고 그걸 들고 책상으로. 에고 허리야. 적당히 자리가 남는 곳에 놓으니, 다행히 차지하는 풋프린트는 적었으나 역시 액정은 컸다. 그래도 본체 자체가 얇삽하니 큰 문제는 없었다 대충 대각선으로 보기 좋은 각도로 놓았다. 이쯤이면 책상에 앉아서 작업하기에도 누워서 동영상을 감상하기에도 좋을 터였다. 설치는 간단했다. 그냥 전원 코드만 꽂으면 됐다. 내가 마지막으로 쓰던 때에는 여기에 키보드와 마우스가 추가 되었지만(나중엔 무선으로 바꿨지만, 참고로 아이맥과 함께 에어포트 익스프레스를 사서 인터넷은 처음부터 무선랜으로 연결했었다) 이젠 그것도 무선이니 뭐 삐져 나올 선은 전원선 밖에 없다.
아이맥에서 내가 인상깊었던건 시종일관 화면이었다. 큼지막하고 밝고 화사하고 시야각 넓은 화면. 사실 놓고 보니 얇은건 잊혀져가고 그 화면이 도드라졌다. 21" 아이맥이 켜서 작동하던 시간 중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하지 않았던 시간을 제외하면 아마 거의 동영상을 재생하지 않았을까?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니터가 eIPS 모니터였는데, 여기에 비할 수가 없었다. 화면의 질의 차이가 있더라. 흠 아무튼 역시 화질 좋은 큰 화면은 있어보고 볼 일인가. 동영상을 많이 봤던 기억이다. 다만 스피커가 좀 텅텅 울리는 느낌이라 아쉬웠을 뿐. 동작할때나 동작하지 않을때나 매끄럽고 조용하고 그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존재감은 올인 원 데스크톱의 전유물이지 싶다.
이 녀석이 집에 오고서 오랜만에 책상에 앉아서 자판을 두드렸는데 그냥 왠지 ‘일을 하는 듯’한 일이 들었다. 집중이 된다고 해야하나. 나는 포스트 하나를 마치고. ‘아, 역시 본격적인 일은 앉아서 데스크톱으로 해야하나?’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시간이 되서 21" 아이맥을 포장해서 건네며 27" 아이맥을 받았는데 그야말로 되로 주고 말로 받다라는게 이런것일 듯하다. 포장을 해서 보낼 채비가 된 21" 아이맥 상자를 준비 하며 문을 여니 저기에 집채만한 27" 상자가. 아이고… 21"까지는 그럭저럭 가볍게 설치했다지만 이 녀석은 급이 달랐다. 뭐 스티로폼을 제거하거나 포장을 제거하는 요령은 이제 생겼는데 문제는 이걸 드는 순간 으악! 무겁다. 상자에 경고라도 좀 써놓으란 말이다… 낑낑거리며 올려놓고 나니 허리가 비명을 지른다. 같은 수순으로 전원만 연결하고 키보드와 마우스의 전원을 켜고 본체를 켜자.
우왓. 화면은 생각했던것보다 크고 해상도가 넓다. 아이콘 하나가 정말 작고 Safari 창 두개를 동시에 띄울 수도 있더라. 21"와 같은 위치에 놓고 앉아서 작업하니 화면 전부를 보려면 고개를 돌려야 할 정도. 동영상 하나를 띄우니 참 그것 또한 절경이다. 크기까지하니 더욱 그러하다. 침대에 누워 화면을 감상하니 이것도 참. 액정의 질도 21"에 지지 않을 만큼 좋았지만 잔상문제는 신경이 쓰였다. 통이 커져 그런지 소리는 훨씬 크고 안정적이었다.
사실 말해서 나는 앉아서 컴퓨터를 장시간 쓰지 않다보니 사용시간 자체는 크게 많지가 않다. 헌데 큰 화면의 매력이 나한테 ‘아, 데스크톱을 해야하나?’라는 고민을 하게 했다. 나는 사실 이전까지 다음 컴퓨터가 노트북이 될 것이라는데 크게 의문이 없었다. 어쩌면 한 대 살지는 몰라도. 그런데 어느새 본격적으로 아이맥 구입을 타진하고 있었다. 퓨전드라이브를 넣니 마니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산을 세우고 상의를 하고 허락을 받고 다 됐다 싶을 무렵. 레티나 맥북 프로가 리프레시 됐다! 사양이 바뀌었고 가격이 내려갔다. 내가 알아봤던 16G/512GB 플래시드라이브가 가격이 400만원을 웃돌았는데 이젠 349만원인것이다. 맥북프로 13" 라인업들도 싸졌고…
그렇다면. 이렇게하면 어떨까란 생각을 하게 된것이다, 선더볼트 디스플레이를 같이 사서 맥북프로를 물리면?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다시말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노트북에 외장 디스플레이를 연결하는 환경은 포스트를 썼을 정도로 알고 있을 뿐더러 15" 맥북프로도 가끔 외장 디스플레이에 연결해 사용한다. 다만 그게 불편한게 연결선이 어댑터때문에 거치적 거린다는것과 내장 스피커를 사용해서 소리는 확장되지 않는다는것이다. 내가 외장디스플레이가 있었음에도 아이맥에서 만족하는 이유는 화질뿐이 아니고 이 매끄러움에 있다.
하지만 선더볼트 디스플레이에는 선 하나에 이더넷,USB, Firewire, 스피커, 카메라가 다 달려있으니… 게다가 모니터에서 맥북의 전원도 갈라진 선으로 공급되고. 지금 쓰는 15" 맥북프로는 침대위에서 무릎위에 놓고 쓰기엔 좀 크다고 생각했지만 화면+퍼포먼스를 생각해서 한것인데 만약 선더볼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며 오고간다면 13"을 해도 상관없을지 모른다. 이 ‘도킹’을 거추장으로 볼지 아닐지에 달린건데…
하여 지금 고민의 늪에 빠져있다.’침대랩탑족’의 탈출이 이렇게 막판에 이르러 최대 난관에 다다르고 있을줄이야. 책상에 앉을지 말지. 로 시작된 것은 결국 큰 화면을 놓을지 말지에 대한 것으로 옮아갔다. 고민만 깊어져가는 새벽이다… 다시 상의를 해봐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