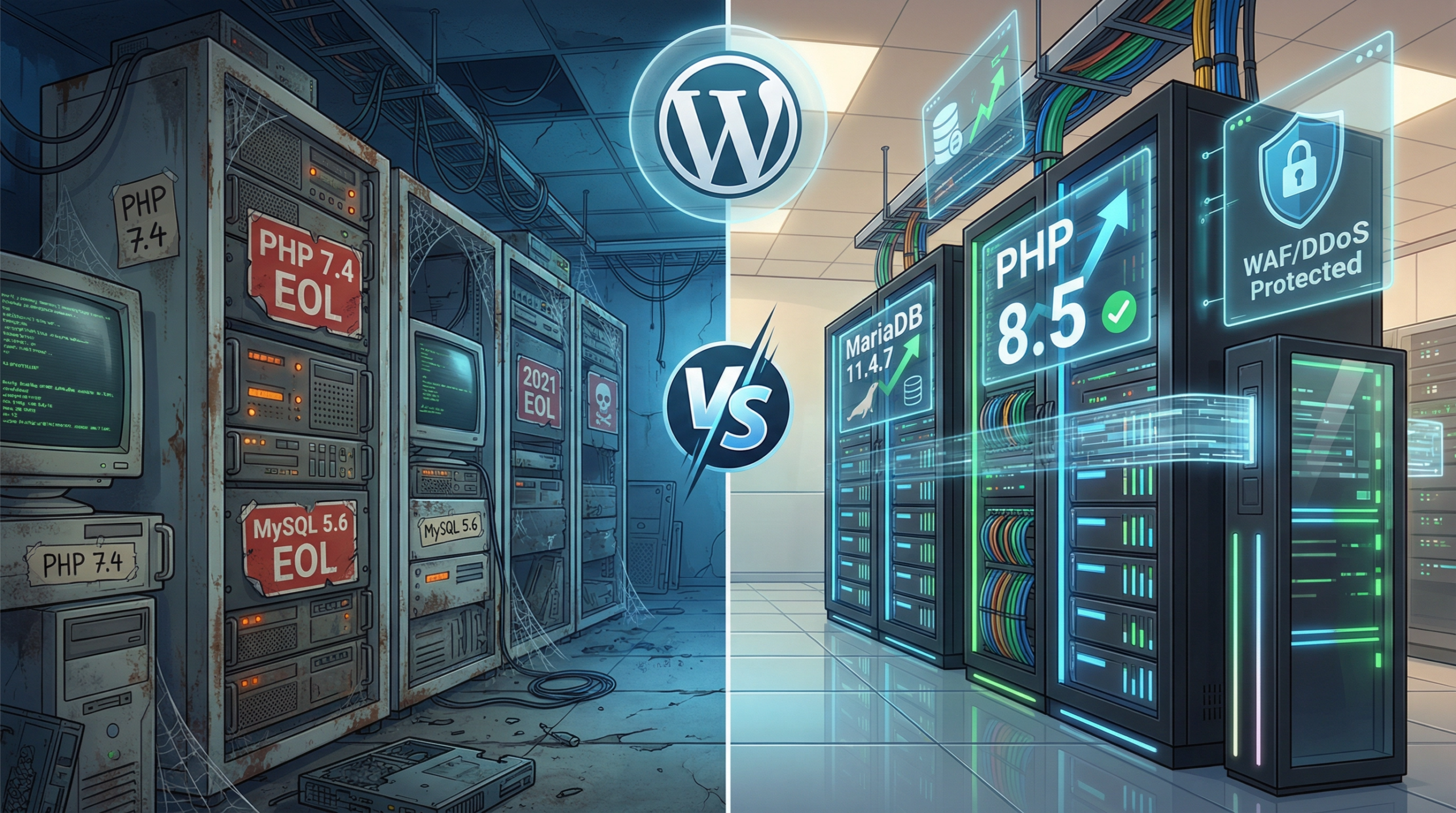내가 보기에 컨텐트는 두가지이다.
바로 일시적으로 향유하는 것과 장기적으로 소장하는 것이다. 아마도 영화를 극장에서 보는 것은 전자일 것이고 DVD를 구입해서 소장해서 즐기는 것은 후자일 듯하다.
왜 영화가 팝콘처럼 터진 돈다발에 환호할때 음반사는 배곪고 있을까?
누군지도 모를 음악 평론가 한분께서 인터뷰 한 기사(클릭)를 보고 이 글을 쓰니 그 기사를 보고 나머지를 읽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영화의 경우, 온라인에서 무료 유통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는 했지만, 길이가 워낙 긴 동영상이기 때문에, 음악만큼 활발한 온라인 불법 무료 유통이 일어나지 않았다”며 “결국 영화와 음악의 음원 길이와 용량 차이가, 영화 시장과 음반 시장의 희비를 낳고 만 것”
그 사람 주장대로라면 음악은 하나에 수메가 바이트면 돈주고 사는 CD만큼의 음질의 음악을 볼 수 있는 반면 영화는 그 양이 많아 수월치 않아서기 때문이라고 한다. 허나 그것도 이젠 틀린 말이다. 영화 한편은 보통 2개에서 3개의 700MB 파일로 나뉘는데 VDSL이 있는 곳에서는 1분에서 2분 남짓안에 파일 하나를 다운로드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VDSL 정도의 속도라면, HDTV 스트림을 실시간으로 틀어도 상관이 없을 수준의 속도가 이론적으로 보장되므로, 사실상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영상을 봐도 끊김이 없다는 얘기도 될 수 있다.
“국내 영화의 경우, 영화가 인터넷에서 무료 불법 유통되지 못하도록 적절히 대응한 것도 주효했다. 해외 영화의 경우, 국내 영화에 비해 여전히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보는 이들이 많아, 영화 흥행이 한국 영화쪽으로 쏠리게 됐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국산 영화에 대한 단속으로 인해서 외국 영화가 주로 유포되어 국산영화의 인기를 진작시켰다는 소리는 납득하기 어렵다. 최근의 거의 대부분 해적판 영화의 주된 타입은 이른바 ‘DVD립’ 과 ‘캠 버전’이 있는데, 해외 영화가 개봉이 빠르면 우선 그쪽에서 가정용 캠코더로 촬영한 영화가 ‘릴리스’ 되어 풀리는데, 아시다시피 국산 영화는 어차피 개봉을 하기 전에는 ‘캠버전’이 돌수가 없다. 그건 피차 외국영화도 마찬가지지만, 다만 저쪽이 빠르기에 우리보다 개봉전에 도는게 가능하다. 그리고 일정시간이 지나면 DVD가 해외에서 출시되는데 당연히 개봉이 이른쪽에서 먼저 출시된다. 그러므로, 심지어는 우리나라 영화가 개봉할 즈음 저쪽에선 DVD가 나와서 ‘금주 개봉작’이 최신 자료가 되어 도는일도 다반사가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인터뷰를 한 김작가씨(이 실명 맞으십니까?)가 말한데로 강한 단속(이른바 ‘영파라치’)과 최소한의 자정노력(?)으로 우리나라 영화는 외국 영화에 비해서 극장 영화 흥행에 해가 될만한 일은 없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영화는 DVD가 돌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도니까.
하지만 내 생각에 영화와 음악은 조금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미 영화는 멀티플렉스와 그를 위시한 상업시설을 통한 일종의 ‘어뮤즈먼트’화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번화가마다 멀티플렉스를 비롯한 각종 시설들이 있고, 영화를 보는 것이 마치 놀이공원의 ‘탈것을 탄다(take a ride)’의 개념으로 변모했다고 봐야하지 않을까? 마치 놀이공원에 와서 ‘뻔한’ 제트코스터와 ‘회전목마’ ‘바이킹’을 타듯이. 이러한 주장은 실제로 비디오가게가 점차로 문을 사라지는 추세에 있다는 것으로 뒷받침된다. 이게 핵심이다. 기억해두라. ‘탄다’라는 개념을.
음악으로 이러한 개념을 옮기자면, 현재 음악 산업이 현재 묻혀가는 DVD 대여점과 비슷한 양상이라는데 있다. 이미 디지털 시대에 와서는 CD나 레이저디스크, 비닐 레코드 처럼 구시대에 그러했던 것 처럼 손에 집을 수 있는 ‘미디어’는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되었다. 또한 디지털 시대에서는 영화나 음악 같은 디지털 미디어 컨텐트의 ‘소유’나 ‘소장’이라는 개념도 마찬가지가 되었다. 만일 버튼을 눌러 수초내에 원하는 음악을 다운로드 받아 들을 수 있는데, CD를 사고, 비닐을 벗기고, CD를 꺼내서 리핑을 하고 또 CD를 고이 모셔두는 것은 이제는 뒤쳐진것으로 치부된다는 것이다.
또한 소장이나 소유의 개념 또한 마찬가지여서 ‘곰TV’나 ‘하나TV’ 같은 VOD서비스나 P2P를 통한 비디오 혹은 미디어 파일의 다운로드가 무척 간편해지고 속도 또한 빨라져서, 마치 TV 채널을 옮겨가며 즐기듯, 원하는 미디어 컨텐트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러한 범위는 점차로 컴퓨터에만 국한되던 것이 점차로 거실로 확대되고, 휴대용 장치로 확대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면 ‘멜론’의 경우, 컴퓨터로 듣고, MP3로 저장해서 들을 수 있는데, 5천원을 내면 얼마든지 자신이 원하는 곡을 언제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그 곡 자체의 가치는 거의 ‘0’가 된다. 게다가 그 회사의 라이브러리 전체를 자신이 필요할 때 쓸 수 있으므로, 역시 그것을 겨울나기전의 다람쥐 도토리 쌓듯 모아봐야 득이 될게 없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음반 형태로는 음반 업계는 절대로 생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미 미국, 일본, 영국, 유럽 국가에서 iTunes Music Store를 통해 입증된바 대로 이제는 디지털 방식의 유통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지금이라도 본격적인 시작을 해야한다고 본다. 언제든 다운로드 가능하고 적당한 가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한도 적당히 풀어줄 필요가 있고 말이다. 자유이용권입네 하고 팔아서는 이거 안되 저거 안되 그러면 누가 사겠나? 공짜로 받으면 애플 MP3에서도 듣고, 아이리버 전자사전에서 듣고, 코원의 PMP에서 듣고, TV로 듣고, 컴퓨터로 들을 수 있고, CD로 굽고…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데 누가 돈주고 아무것도 안되는 것을 사겠느냔 말이다.
디지털 컨텐트의 가격에 있어서는–조금 논점외라고 생각되지만 나온김에 말하자면–항상 이러한 논쟁의 중점이 되어 있었다. 컨텐트를 파는 쪽에서는 이정도가 적정선이라고 근거를 대고 주장하고, 사는 쪽에서는 그게 그렇지 않다고 반박한다. 내가 보기에는 이렇다, 결국은 컨텐트 또한 상업적인 제품이다. 만일 팔리지 않는다면 좀더 유연한 자세로 요금이나 제한을 풀어주어야 한다. 시장에 토마토가 오래돼서 짓물러가도록 안팔리면 값을 깎아서라도 팔아야 조금이라도 손을 덜본다. 그런데 음반 업계가 하는짓이라는 것이 짓물러가는 토마토를 좌판에 내놓고는 그대로 값을 받겠다고 게슴프레 인상쓰고 앉아서 ‘경기가 영 않좋네…’ 손부채질 하는 꼴이라는 것이다. 짓물러가는 토마토라면 저쪽에 옆집에서 가져다 버린 것 줏어 오는게 돈 아끼는 법이다. 아니면 싱싱한 토마토로 바꿔서 팔던지…그렇지 않은가?